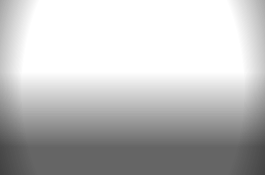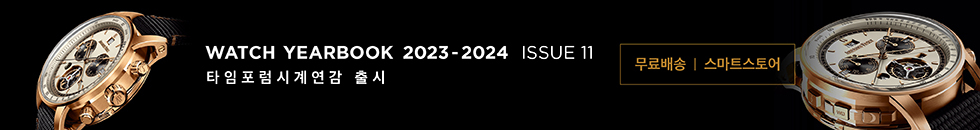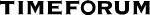칼리브 드 까르띠에 멀티플 타임존

피지(Fiji)의 수도 근방에 있는 섬.
여행을 자주 할 기회는 많지 않지만, 여행을 하게 되면 늘 하는 제스쳐가 하나 있습니다. 별건 아니고 팔을 양 쪽으로 쭉 펼친 다음,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폐를 바닥까지 들이마시는 것 입니다. 단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게 아니라, 폐가 위 천장에 닿게 하겠다는 상상을 하며 끝까지 들이마시는건데, 저는 이렇게 함으로서 여행의 시작과 끝을 만끽하곤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나라 국기를 수집하고, 다른 어떤 분은 반지를 수집하기도 하는데, 그 방법과 이유는 다 다르지만 이런 행위의 본의는 여행이 모두에게 색다른 기분을 안겨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상징인 것이죠.

스윽 시선이 떨어지다가 잠시 시선이 머물만한 재미있는 아이탬이 있다는건 보기만해도 흐뭇해집니다.
심볼(Symbol, 상징). 상징의 힘은 물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강력합니다. 수트 속에 숨겨진 땡땡이 양말이나, 빨간 팔찌 같은 것들을 신거나, 두르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고 망중한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같은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죠. 모두가 스티브 맥퀸이 된다면 세상이 버티지 못하고 말테니, 평화를 수호하면서 킹 오브 쿨이 되는 현실적인 타협안이 상징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까르띠에 저스트 앵 클루 (Cartier Just an Clou)
까르띠에는 심볼이 가지는 의미를 멋지게 구체화해주는 브랜드 입니다. 저스트 앵 끌루(Juste an Clou) 처럼 세련되면서도 예술적인 브레이슬릿도 만들 줄 아는 회사니, 분명 한 차원 더 높은 아름다움을 위해 파인 워치 메이킹을 시작했을 것 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까르띠에의 시계를 마스터피스라고 인정하지만,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까르띠에 입장에서 '진짜 시계'를 만들겠다는 마음을 먹고, 매뉴팩처를 건설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본 사업 궤도가 아무리 무난하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다른 것들을 시도하다가 망가지는 사례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소위 주얼리 브랜드들이 '시계'라는 세계를 다시 보기 시작한 기저에는 까르띠에가 그 선구자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이 있으며, 성공가도를 달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이제는 미스테리 워치를 제작한 상징성으로 그 입지를 확실히 다졌습니다.

종목을 떠나, 상술과 공수표가 난무하는 시장통에서 아직까진 정직성이 통할 수 있는 청정지역은 시계 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까르띠에는 '진짜 시계'를 만들어보겠다고 칼을 뽑았고, 당당히 파인 워치(Fine Watch, 고급시계)라는 이름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이 이름에 아무도 반기를 들지 못합니다. 왠만한 매뉴팩쳐보다 잘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기술보다 한 차원 더 위에 있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마켓리더, 진짜 매뉴팩쳐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칼리브 드 까르띠에 멀티플 타임존 (Calibre de Cartier Multiple Timezone)

리치몬트 그룹 산하에서 까르띠에라는 이름이 가지는 파워 역시 막강합니다. 행간에는 까르띠에의 성공이 리치몬트 그룹의 그늘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속내는 이러한 편견이 말 그대로 '편견'이게 합니다. 손목시계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시계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면 교과서적으로 접하는 내용이 되었고, 시계의 당위성이 중요시 되는 고급 시계 시장에서 까르띠에는 왜 이제야.. 싶을 정도로 그 명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칼을 뽑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역사성이 튼튼히 자리잡고 있는 모델 위에는 어떤 기술을 쌓아도 빛이 나기 마련이지만, 까르띠에는 옛 명성을 퇴색시키지 않을 정도의 새로운 명성을 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리치몬트의 R&D 파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무브먼트 MC 9909의 모습.
무브먼트인 MC 9909는 오로지 이 시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트 매커니즘과 비슷한 디스플레이 디스크에 스프링 방식의 캠을 달아서 퀵체인지를 구현했습니다. 크라운가드 상단에 위치한 버튼을 푸시하면 총 세 가지가 바뀌는데, 아워 핸즈(Hour hand)와 케이스의 옆에 위치한 시티 디스크(City disc), 그리고 하단에 위치한 레트로그레이드가 그것입니다. 기존의 지앰티 워치와 달리 매커니즘이 적용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며, 데이트를 고정하는 스프링 역할을 하는 캠을 들어서 GMT를 변형하는 매커니즘이기 때문에 버튼을 누를때는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동감기 장치와 크라운은 자동 무브먼트의 감성을 성공적으로 살려냈습니다.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1단으로 뽑은 용두는 가벼우나 정확하게 원하는 시간을 가리킬 수 있으며, 로터는 효율성의 수준을 지나 경쾌하게 회전합니다.

볼륨감 있는 케이스에 단정한 비율로 들어서 있는 다이얼의 배치는 45mm라는 사이즈가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레귤레이터는 에타크론 레귤레이터에서 한층 더 진화한 방식의 레귤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신 방식이라고 볼 순 없지만, 기술이 검증된 한도 내에서는 최선의 레귤레이팅 방식입니다. 스터드를 돌려 시간을 조정하는 기존의 레귤레이팅 방식은 미세조정이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밸런스 휠 방향의 핀을 통해 밸런스 휠의 텐션을 변경하여 세부적인 시간을 조정합니다. 이 방식은 충격으로 인한 시간 변경에 가장 큰 강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잉카블록 같은 쥬얼 캡의 방식으로 부품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격으로 인한 시간 변동은 등시성의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단차나 텐션이 조금만 엇나가도 오차가 4-5시간이나 발생하는 예민한 밸런스 스프링 때문에, 밸런스휠을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밸런스휠과 스프링이 괜히 심장에 비유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9909의 심장은 무난한 방식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는 보기만 해도 배부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돈되어 있는 케이싱의 브러쉬드 처리가 심미적인 풍성함을 선사합니다.
무브먼트 데코레이션은 파인워치라는 이름에 걸맞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 화려하게 가지 않았지만, 해야 할 것들은 꼼꼼히 다 해냈습니다. 자동감기 모듈을 핑거브릿지 양식과 통일하여 디자인 했기 때문에 다소 평면적이지만, 래칫휠과 리버싱 휠이 보이고, 그 틈 사이에 심장이 있는 모습은 무브먼트 본연의 모습을 다 하고 있습니다. 평범하다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브먼트에 대한 높아진 마니아들의 눈높이 뿐 입니다. 블루스크류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불로 굽는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모두 해냈습니다. 예전에는 블루스크류 사용 자체가 시계의 급을 한 단계 높인다고 인정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블루스크류를 만들었죠. 그러나 불에 굽지 않은 블루스크류는 논외로 하더라도 블루스크류에도 그 급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물론 '불에 구워야' 블루스크류가 되지만, 파란 것 자체로 블루스크류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양산브랜드들이 그냥 '굽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룩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세척하는 과정을 생략한다던가, 스크류 헤드와 나사 부분을 폴리싱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것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과정들이 피니싱에 더욱 중요 요소인데도 말이죠.

계속해서 스크류 이야기를 하자면, 까르띠에 무브먼트에 들어간 모든 스크류는 굽는 과정을 제외하고 세척 및 폴리싱까지 마쳤습니다. 스크류는 비교 대상만 존재한다면 피니싱 여부를 즉각 알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파란가, 파란게 아닌가가 아니라, 손을 댄 스크류냐, 아니냐로 말이죠. 게다가 자사무브먼트 제작으로 판도가 바뀐 이후부터 블루스크류를 쓰지 않는 무브먼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파인 워치 메이킹에 블루스크류 하나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앵글라주나 페를라주를 이렇게 꼼꼼하게 완성하는 브랜드에서 블루스크류 같은 요소를 간과했을리 없습니다. 안하는 것이죠. 까르띠에가 무브먼트에 대한 이해와 시간에 대한 접근 철학은 상상 이상으로 진지합니다. 파텍필립(Patek Philippe)이 블루스크류를 쓰던가요? 라는 질문 하나만으로도 블루스크류는 해석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스크류가 파랗지 않더라도 스크류에 신경을 썼는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소비자와 그것이 데코레이션인지 테크닉인지 판단하는 워치디렉터의 몫 입니다.

양감이 뚜렷하게 드러나있는 다이얼은 복잡해보일 수 있으나, 색감을 통일함으로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케이스의 질감은 '골드'라는 소재를 가장 잘 뽑아쓰는 브랜드라는 명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줍니다.
다이얼은 앞면 뿐만 아니라 옆면까지 고려했으며, 단차를 두어 입체적입니다. 핸즈가 많고, 보여주는게 많다보면 복잡해지기 마련인데, 까르띠에는 기요쉐의 웨이브와 레이어로 자칫 복잡해질 수 있는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인덱스 뿐만 아니라 다이얼은 전체적으로 입체적이기 때문에 시계에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단차로 분리된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볼륨감 있는 핸즈를 사용하였고, 기요쉐의 톤을 메탈릭 그레이로 통일함으로서 단아한 멋을 지켜냈습니다.

언젠가는 훌쩍 떠나보겠다는 마음으로..
케이스 또한 볼륨있습니다. 9시 방향의 케이스를 보면 씨티-디스크(City disc)라 불리는 트래블 타임 인디케이터가 있으며, 이것은 크라운 위쪽 방향에 있는 푸시버튼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시간을 표시하는 센스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푸시다운&업 버튼은 다이얼의 레트로그레이드 인디케이터를 1시간 간격으로 조정합니다. 이 윈도우는 24시간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서머타임으로 인한 미세한 로컬-GMT 시간 조정 뿐만 아니라, 두 지역의 시간차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디스플레이 매커니즘으로 인한 두께는 어쩔 수 없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12시간계에 익숙해져 있어 '본국 시각 4시'가 오전 4시인지, 오후 4시인지 헷갈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죠. 너무 상세한 것까지 고려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즈니스 워치의 GMT는 이렇게 접근해도 과하지 않다 해석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디플로이언트 버클은 까르띠에 특유의 스타일을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이단 디플로이언트 버클은 착용했을 때 부드러움에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착용했을 때, "딱" 소리를 내며 경쾌하게 붙는 버클은 탈착 여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간혹 고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 텐션의 디플로이언트 버클은 낙하의 위험때문에 유저를 조마조마하게 하곤 하니까요. 처음 보면 다소 어색한 버클 모양이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버클에서도 까르띠에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라운에 들어간 보석을 흔히 '카보숑(Cabotion)'이라고 통칭하곤 하는데, 카보숑은 '두개골'을 의미하는 카보슈(caboche)에서 나온 말로,
표면에 파셋(커팅 면)이 없는 둥근 보석을 의미합니다. 이건 스위페(suiffé)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라운에 들어간 사파이어 스톤은 회색빛 시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날씨 좋은 날 바라보는 푸른 빛 사파이어 스톤은 심미적인 청량감을 주기 충분합니다. '까르띠에는 보는 사람(오너가 아닌)이 더욱 아름답게 본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디자인 컨셉은 분명 비즈니스 월드타이머이긴 합니다만, 케이스의 단차, 케이스 피니싱의 질감, 다이얼의 입체감, 그리고 시계의 중량감까지. 무브먼트 디자인과 앞서 언급했던 미학적인 배치들은 이 시계를 착용하는 유저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머리 끝까지 끌어올려 황홀하게 폭파시킵니다.

물론, 파인 워치 메이킹의 시계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의 물건이 아닙니다. 이 시계의 상징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시계가 상징하는 바를 누릴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뒷바침 하는 사람이라는 직관적인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인 워치 메이킹 라인업의 시계는 아무나 살 수 있는 시계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나 파인 워치 메이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까르띠에는 워치메이킹을 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까르띠에는 그 이름만으로도 상징(symbol)이기 때문입니다.

리뷰협조 까르띠에 코리아
촬영협조 2nd round studio 김두엽님
Copyright ⓒ 2012 by TIMEFORUM All Rights Reserved
이 게시물은 타임포럼이 자체 제작한 것으로 모든 저작권은 타임포럼에 있습니다.
허가 없이 사진과 원고의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97조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임포럼 뉴스 게시판 바로 가기
인스타그램 바로 가기
유튜브 바로 가기
페이스북 바로 가기
네이버 카페 바로 가기
Copyright ⓒ 2024 by TIMEFORUM All Rights Reserved.
게시물 저작권은 타임포럼에 있습니다. 허가 없이 사진과 원고를 복제 또는 도용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100
- 전체
- A.Lange & Sohne
- Audemars Piguet
- Ball
- Baume & Mercier
- Bell & Ross
- Blancpain
- Breguet
- Breitling
- Buben Zorweg
- Bulgari
- Cartier
- Casio
- Chanel
- Chopard
- Chronoswiss
- Citizen
- Corum
- Frederique Constant
- Girard Perregaux
- Glycine
- Hamilton
- Harry Winston
- Hermes
- Hublot
- IWC
- Jaeger LeCoultre
- Junghans
- Longines
- Luminox
- Maurice Lacroix
- Mido
- Montblanc
- Omega
- Oris
- Panerai
- Parmigiani
- Patek Philippe
- Piaget
- Rado
- Richard Mille
- Roger Dubuis
- Rolex
- Seiko
- Sinn
- Stowa
- Suunto
- Swatch
- TAG Heuer
- Timeforum
- Tissot
- Ulysse Nardin
- Vacheron Constantin
- Van Cleef & Arpels
- Zenith
-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