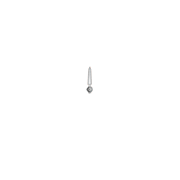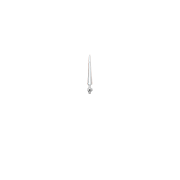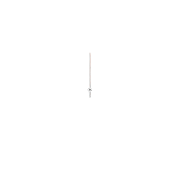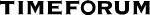자유게시판
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타포를 들어와서 포스팅 된 글을 읽다보면
종종 '4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류의 고민들을 접하곤 합니다.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40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
'살아온 날들보다 살 날이 더 많다' 라고 박박 우겨보지만 (환갑을 100세로 잡는 시대를 기대합니다),
'아, 내가 나이을 슬슬 먹어가는구나' 싶어서 살짝 처량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60년대생입니다. 소위 말하는 386세대죠.
80년대 이도저도 아닌 정체성의 혼란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며 산 세대입니다..
(라고 거창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 생각없이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왔습니다)
주말에 혼자 사무실 나와 앉아있으니 이생각 저생각 많이 드네요.
어쨌건 기분도 낼 겸해서 김상희님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을 유투브에서 찾아서 틀어놓고는
혼자서 온갖 폼을 다 잡습니다.
갑자기 어릴적 생각이 나서 군내나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몇몇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터인데,
학창시절 (아마 중학생일때) 하얀색 바탕에 빨간 마크가 선명한 '나이키' 신발과
'워크맨'으로 대변되는 일제 전자기기 (소니, 파나소닉, 아이와 등등)는
월말고사에서 성적이 오르는 조건으로 부모님과 딜을 시도하던 저의, 아니 아마 모든 학생들의 꿈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딜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만.. ㅜ.ㅜ)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레코드방'에서 카세트테잎을 녹음해서 듣곤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의 궁핍한 주머니 사정으로 봐선 그리 작은 돈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이 게일스 밴드니 레이프 개럿이니, 지금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가수들의 곡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테잎으로 만들었었죠.
알량한 용돈을 쪼개서 구입한 '월간 팝송'이라는 똥종이 잡지로 팝음악에 대한 갈증을 풀고,
말도 안되는 영어를 한글로 적어다니면서 외우곤 하던,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이 화끈해지는 짓들도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당시 나름 부유(?)했던 저희 집에는 태광산업에서 나온 인켈이란 '전축'이 있었습니다.
마치 서랍장처럼 생긴 커다란 외모에 좌우측 스피커가 일체형으로 붙어있고,
대문을 열 듯 양쪽으로 문을 열면 그 안에 LP플레이어가 있고 라디오 등이 몇단으로 앉아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지도 않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때는 포스트모던 스타일의 은색으로 반짝이는 외모에 작은 스위치가 추앙받던 시절이었으나,
이제는 복고, 빈티지 또는 촌스런 디자인의 제품을 더 좋아라 하는 시대가 됐으니,
유행이 돌고 돈다는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태리에서 수입된 피아트라는 자동차 생각나시나요?
(사실 피아트는 메이커 이름이었지만 당시는 그냥 그렇게 통칭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홍신 작가의 유명했던 어느 소설에 표현된 것처럼
'큰 눈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발랄한 계집아이'같은 아주 이쁜 차였습니다.
그당시 브리사라는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차가 있었고,
포니1이 막 현대에서 생산되어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어린 막눈에 브리사나 포니1은 어딘지 어설프고 피아트는 세련된 아름다움이 충만한 그런 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것은 똥도 좋다'라고 세뇌당했던 시대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련한 첫사랑의 풋풋한 추억,
중학교 입학선물로 받았던 파카 만년필,
성룡의 영화 '취권',
교련복 입은 대학생들,
황홀했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첫경험,
또 뭐가 있을까요?
비온뒤 흙길같은 질척거리는 구닥다리 얘기지만
그 시대를 지내왔던 아저씨들과 잠시나마 기억을 공유하고 싶어서 한 자 적어봤습니다.
40대, 50대, 60대 (혹은 그 이상 연배의 회원이 계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저씨들! 파이팅입니다.
(뭐 멋지게 끝낼 말이 생각이 안나서.. 뜬금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