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아름다움으로의 초대 (Part 1)
아름다움으로의 초대
(part 1)
2011년 06월 09일
소고지음
발단
요즘처럼 햇살이 피부 껍질을 모조리 녹여버릴것만 같던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모두를 뜨겁게 달궈놓았던 2002년의 붉은함성도 한철 매미처럼 소리없이 사그라들고, 100년만에 내렸다는 폭설도 모두 녹아 대지에 자양분이 되어버리고 다시 더워지기 시작하는 2003년의 여름이었죠.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부채를, 다른 한 손에는 버스 손잡이를 붙잡고, 귓바퀴 주변에서는 린킨파크의 그로울링이 쉴새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찌는듯한 더위에 버스 에어컨은 고장이 난 듯, 기사님께서는 셔츠자락을 반쯤 풀어헤치고 손부채를 연신 흔들어댔고, 저는 하교길 버스 다양한 학생들 사이에 끼어 비지땀을 연신 흘려댔습니다. 한 시간이나 지났을까. 버스는 드디어 집근처 정거장에 도착했고, 저는 날렵한 살쾡이로 빙의하여 과자박스만한 찜통 버스안을 얼른 탈출했었습니다.

곧장 버스에서 내린 저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쉴 틈도 주지않고 푹푹 올라오는 아스팔트 열기에 저는 정거장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멀지도 않았음에도 땀은 비오듯 흘렀습니다. 교과서로 태양을 가려가며 집을 향해(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집안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향해) 남은 생명을 짜내가며 걸음을 내딛었지만 길은 멀고 또 험하기만 했죠. 걷는것과 아이스크림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걷자, 걷자, 걷자, 걷자.. 수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뇌까리며 오로지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기를 수차례 반복하는데...
'어라?'
순간 바늘구멍처럼 좁아진 저의 시야가 어딘가에 꽂꽂히 박혀버리는바람에 저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시선이 고정된 그곳은 베스킨라빈스도 동네 슬러시 기계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노점에서 시계를 파는 허름한 가판대. 1평 남짓한 테이블 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시계의 ‘시’자는커녕, 시계를 차며 자랑을 하는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알마니? 뭐니 그게. 쥐샥? 새로나온 비타민이니 하며 멋부리기는 커녕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옮겨다니기에만 급급했고, 보이는 정보란 정보는 족족 머릿속에 몰아넣기 바쁜 대한민국 예비 수능인 중 한명일 뿐이었습니다. 1인당 1만 5천원이 넘는 음식은 밥이 아니라 사치라며 사줘도 입에 대지도 않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무엇이라도 홀린 듯 길거리 초라한 노점상 앞에 거짓말처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1평도 안되는 자그마한 벨벳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는 한 시계에서 눈을 떼질 못했습니다.

생전 처음보는 브랜드의 시계였습니다. 지금와서 회상해봐도 어디, 어떤 브랜드 짝퉁은커녕 시계를 만든 디자이너가 초등학생이었나 싶던 어설픈 디자인이었습니다. 디자인을 배끼기도 귀찮아 아무렇게나 시계 모양이겠거니 만들어서 파는 이른바 ‘길거리’표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계에 ‘꽂혀’버렸죠. 그때가 생애처음. 난생 처음으로 ‘지름신’을 영접했던 순간이었을겁니다. 샛노란 색깔의 초침과 울퉁불퉁한 튜브모양의 검정색 링이 어설프게 베젤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모양도 안나오는 그 시계가 순수하디 순수했던 저의 심박수를 120, 130, 140으로 요동치게 만들었던거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대상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질러줘, 어서 나를 질러줘...”하는 그런 음성 말이죠.)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요리조리 흔들어가며 지름신의 환상에서 깨어난 저의 손바닥 위에는 그날 저녁밥값이었던 7000원짜리 지폐뭉치가 아니라 그 노랗고 울퉁불퉁한 못난이 시계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모습은.. 뭐라고 해야할까요.

마치
절대반지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사랑스럽게,
지그시 그것을 응시하는
골룸 한 마리와도 같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날 저는 저녁을 굶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뭐 한끼정도 굶는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는걸 직접 체감했던 의미있는 날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기념일과도 같았던 첫 경험이었죠. 이후 필요한게 생기면 ‘굶어가며 돈을 모으면 되는구나’라는 멍청한 다짐을 하게 해주었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그때 닫힌 제 성장판을 다시 오픈업!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저는..) 어찌됐건 저는 행복했고, 또 다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굶었습니다. 대전 촌놈이 나름대로의 ‘멋’을 찾기 시작한거죠. 다시 그때 그 시계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그 아름답고 또 소중했던 ‘절대시계’는 산산히 부서집니다. 애지중지하며 모시고 다녔으며, 열심히 닦아가며 사랑했던 시계의 파괴에, 저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서진 조각조각을 찾아 나름대로 조립을 해서 열심히 차고다닐 뿐이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계는 다시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결국 산산히 파괴되기에 이르릅니다. 저는 부서진 파편들을 주섬주섬 모아들고 차마 닫히지 않은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리저리 그 녀석을 살펴보며 추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아... 그제서야 저는 제 시계가 부서질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기랄...
-Part 2 에 계속...-
타임포럼 뉴스 게시판 바로 가기
인스타그램 바로 가기
유튜브 바로 가기
페이스북 바로 가기
네이버 카페 바로 가기
Copyright ⓒ 2024 by TIMEFORUM All Rights Reserved.
게시물 저작권은 타임포럼에 있습니다. 허가 없이 사진과 원고를 복제 또는 도용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22
-
공감:1 댓글
-
우오옷!! 팀님!! ^&^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글빨도 예전같지(?)않게 되어버린 저이지만.. ^^; 사랑으로 지켜봐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__) (^^)
-
샤베트
2011.06.09 23:15
3~4년전에 타포에 가입했을때 소고님 글들 재밌게 잘 읽었었는데... 그때도 레벨3 밖에 안되는 초보회원이었고, 탈퇴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가입한 지금도 눈팅전문 회원이지만 다시 소고님 글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
^^ 샤베트님 ^^ 이렇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게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사드리지 못했던 기간이 너무 길어 알아봐주시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을것 같아서, 재야의 고수님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 많이 했었는데..
샤베트님의 첫 댓글이 저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잘부탁드립니다.. ^^
-
소고님 웰컴백!!!!!!!!!!!!!
이제 저같은....레벨에 뉴스만 쓸수있는 글쟁이는...좀 쉴수 있겠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볼만한 글이 많아 질거 같습니다!!!!!!!!!!!!!!
-
팜판님!! ㅠ_ ㅠ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팜판님.. 글 너무 좋아요 ㅠㅠ 쉬시면 아니됩니다!! ^^
다시한번 잘부탁드립니다!! ^^
-
피천득의 '인연'에 버금가는 고품질 수필같은 자기 고백이군요.
역시 소고님을 글을 써야 제대로 돌아온거죠. ^^
100% 콩기름으로 짠 백설표 식용유처럼 글이 혓바닥에서 때구르르~ 굴러 갑니다. ㅎㅎ ^^
-
manual7
2011.06.10 02:13
드디어 재입성하셨군요.
'나의 첫 시계' 이런 주제로 운을 띄우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올라올 듯 합니다.
제 사족을 달면 청소년기에 저를 콩닥콩닥 뛰게 만들었던 시계는 기계식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애플 II 컴퓨터로 로드러너나 구니스를 하며 보낸 저로서는 기계식보다는 카시오에서 소개한 태양전지 시계에 열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참 신기했습니다.
지금은 억 원을 호가하는 기계식 시계를 만져볼 기회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린애들도 시계줄을 본인 손목에 딱 맞게 맞출 수 있는 레고 시계 같은 것도 좋아합니다.
특히 스타워즈 버전....
아름다움으로의 초대 (Part 2) 도 기대만빵합니다.
-
신기한시계
2011.06.14 10:58
소고님은 글은 아주 재미가있습니다.
-
제기랄~~ㅜㅜ
-
monk289
2011.07.14 03:30
소소한글의재미가듬븍담겨있네요
-
골룸 가지구싶다...반지대신 시계 끼워놓구싶네요 ㅋㅋ
-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저는 파트2 읽으러 갑니다.
-
우히우헤헤
2011.10.20 15:16
너무 재밋어요ㅋㅋ
-
와치OUT
2011.10.24 15:30
재밌네요 ㅋㅋㅋㅋ
-
파아란달빛
2012.04.11 16:38
재미있게 잘 읽고 저도 파트2로 ~^^
-
쟁이MJH
2013.12.28 10:37
옜날생각나네요!
저와 시계의 추억도 다시 생각해봅니다!
-
다른건 몰라도
한겨울에 한여름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
감사감사
2014.10.19 22:11
맛깔나게 글을 잘쓰시네요^^
-
잘 봤습니다.
-
같은 글이 두개인건가요? 그래도 즐거운 글이네요~
-
같은 내용의 포스팅 같은데 본의아니게 또 한번 재미있게 보고 갑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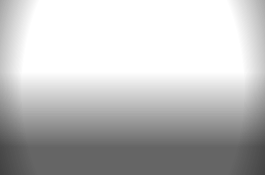















![[Journal] 시계의 역사 (part 1)](https://www.timeforum.co.kr/files/thumbnails/495/111/004/282x200.crop.jpg?20170316131045)
![[예고] 그녀의 질문.](https://www.timeforum.co.kr/files/thumbnails/428/111/004/282x200.crop.jpg?20170316131045)
![[Journal] 정신 못차리는 남자](https://www.timeforum.co.kr/files/thumbnails/277/111/004/282x200.crop.jpg?20170316131045)
![[예고] 정신 못차리는 남자](https://www.timeforum.co.kr/files/thumbnails/201/111/004/282x200.crop.jpg?20170316131045)
![[Journal] 고전의 아름다움 (part 2)](https://www.timeforum.co.kr/files/thumbnails/150/111/004/282x200.crop.jpg?20170316131045)
![[Journal] 고전의 아름다움 (part 1)](https://www.timeforum.co.kr/files/thumbnails/463/072/002/282x200.crop.jpg?20170316131045)
![[Journal] 고전의 아름다움 (part 1)](https://www.timeforum.co.kr/files/thumbnails/079/111/004/282x200.crop.jpg?20170316131045)
![[Journal] 아름다움으로의 초대 (Part 2)](https://www.timeforum.co.kr/files/thumbnails/018/111/004/282x200.crop.jpg?20170316131045)
![[Journal] 아름다움으로의 초대 (Part 2)](https://www.timeforum.co.kr/files/thumbnails/161/058/002/282x200.crop.jpg?20170316131045)
![[Journal] 아름다움으로의 초대 (Part 1)](https://www.timeforum.co.kr/files/thumbnails/507/054/002/282x200.crop.jpg?20170316131045)
![[Journal] 아름다움으로의 초대 (Part 1)](https://www.timeforum.co.kr/files/thumbnails/955/110/004/282x200.crop.jpg?20170316131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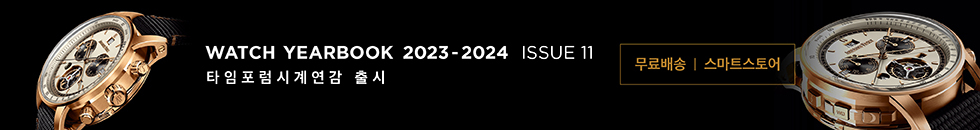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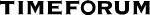
소고님!!!!!!!!!!!!!!!!!! 웰컴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