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쉐론 콘스탄틴 피프티식스 컴플리트 캘린더
















타임포럼 뉴스 게시판 바로 가기
인스타그램 바로 가기
유튜브 바로 가기
페이스북 바로 가기
네이버 카페 바로 가기
Copyright ⓒ 2024 by TIMEFORUM All Rights Reserved.
게시물 저작권은 타임포럼에 있습니다. 허가 없이 사진과 원고를 복제 또는 도용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122
-
몽쉘이
2020.02.08 18:47
피프티식스골즈제품 너무 아름답네요.
-
gmd6964
2020.05.10 01:02
언젠간 손목에 걸쳐보고싶네요^^
-
역시 바쉐론 머리부터 발끝까지 포스가 느껴집니다
-
machoism
2020.07.05 20:04
역시 바쉐론... 굳입니다
-
루네텐
2020.09.28 10:30
바쉐론 멋집니다!
-
바쉐론은 언제봐도 멋지고 고급스럽네요
-
recover
2020.12.10 13:23
신사의 시계네요
-
크리스펜
2020.12.25 14:14
드레스 워치의 정석, 클래식한 느낌입니다
-
다이얼 구성이 조화롭게 잘 정리된 느낌을 받습니다.
-
재찬
2021.04.27 10:27
멋지네요.. 와와
-
영배
2021.05.09 00:07
올려보는게 소원입니다
-
김우럭
2021.05.09 14:48
잘 보고 갑니다.
-
푸우아빠
2021.05.11 22:36
끝판왕에 이유가 있네요
-
푸우아빠
2021.05.13 23:16
세계최고
-
김선
2021.06.08 13:44
너무 멋집니다.
-
조각사
2021.07.29 23:42
너무 이쁘네요
-
벤자민나무
2021.09.07 22:50
오버시즈 다음으로 괜찮은 컬렉션!!
-
강고라니
2021.10.17 14:47
스틸소재가 낯설게 느껴지네요
-
오로메
2022.01.07 14:34
고급감과 캐주얼함과 묘한 흔함의 느낌이 공존하는 시계 같습니다
-
개구리뱀
2022.07.26 14:09
바쉐론은 역시..
-
몽키대폭발
2023.03.02 22:16
골드 케이스부터 문페이즈까지 이어지는 색상 조합이 너무 아름다워요
- 전체
- A.Lange & Sohne
- Audemars Piguet
- Ball
- Baume & Mercier
- Bell & Ross
- Blancpain
- Breguet
- Breitling
- Buben Zorweg
- Bulgari
- Cartier
- Casio
- Chanel
- Chopard
- Chronoswiss
- Citizen
- Corum
- Frederique Constant
- Girard Perregaux
- Glycine
- Hamilton
- Harry Winston
- Hermes
- Hublot
- IWC
- Jaeger LeCoultre
- Junghans
- Longines
- Luminox
- Maurice Lacroix
- Mido
- Montblanc
- Omega
- Oris
- Panerai
- Parmigiani
- Patek Philippe
- Piaget
- Rado
- Richard Mille
- Roger Dubuis
- Rolex
- Seiko
- Sinn
- Stowa
- Suunto
- Swatch
- TAG Heuer
- Timeforum
- Tissot
- Ulysse Nardin
- Vacheron Constantin
- Van Cleef & Arpels
- Zenith
- Etc
-
오데마 피게 밀레너리 프로스티드 골드 오팔 다이얼 ፡ 122
2018.11.27 -
바쉐론 콘스탄틴 피프티식스 컴플리트 캘린더 ፡ 122
2018.11.08 -
그랜드 세이코 하이비트 36000 GMT Ref. SBGJ201 ፡ 128
2018.09.14 -
프레드릭 콘스탄트 클래식 월드타이머 매뉴팩처 ፡ 95
2018.08.31 -
태그호이어 뉴 링크 칼리버 17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41mm ፡ 93
2018.08.17 -
브라이틀링 내비타이머 8 B01 크로노그래프 43 ፡ 119
2018.08.10 -
오피치네 파네라이 라디오미르 3 데이즈 아치아이오 - 47mm PAM00720 ፡ 98
2018.08.02 -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크로노그래프 WT ፡ 118
2018.07.19 -
해밀턴 브로드웨이 오토 크로노 뉴 다이얼 ፡ 72
2018.07.13 -
프레드릭 콘스탄트 하이브리드 매뉴팩처 ፡ 61
2018.07.05 -
라도 트루 오픈 하트 ፡ 55
2018.0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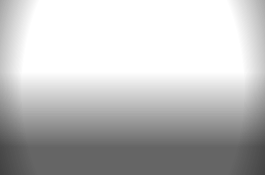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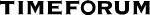
바쉐론 같은 하이엔드에서 56 같은 엔트리 모델은 쫌. 이 라인이 오래 갈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